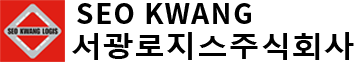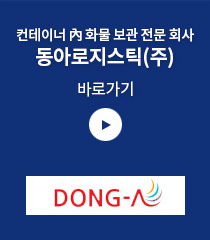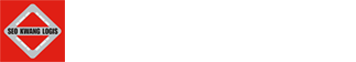'소부장 특화단지' 20곳으로 확대…"세계 공급망 새판짜기 대응"
2030년까지 추가 10곳 지정…'2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도 마련
일본 수출규제 대응→'공급망 전쟁' 대응력 강화로 정책 초점 이동

정부가 미중 신냉전으로 촉발된 세계 공급망 새판짜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 단지'를 현재의 10곳에서 총 20곳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 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종합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
소부장 특화 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 단지들은 기반 시설 우선 구축,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소·부·장 특화 단지는 모두 10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을 소부장 특화 단지로 1차 지정했다.
이어 2023년 7월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미래차), 경기 안성(반도체장비), 대구(미래차), 부산(반도체) 등 5곳을 2차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약 8천명 고용, 수출액 40% 상승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특화 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 특화 단지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나서 내년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2030년 적용될 '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 관계 악화 와중에 일본이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수출 통제에 나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던 2019년에 대일 소부장 의존도를 낮추려고 '1차 소부장 기본계획'(2020∼2025년)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대일본 소부장 의존도가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까지 내려가는 등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에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산업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AI) 혁명과 탄소중립 전환 같은 거대 산업 전환 흐름까지 겹쳐 급속한 공급망 재편에 대처하는 일이 더욱 긴박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글로벌 산업 지형의 대변혁 초래하고, 자국 중심 공급망의 내재화와 더불어 우호국 간의 공급망 블록화 가속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지형 변화는 소재·부품·장비 확보전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갈등이 한국 산업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일 의존도보다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소·부·장 의존도는 2012년 23%에서 2024년 29.5%로 증가했다.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저부가 범용 제품에서부터 전구체,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원료와 주요 희토류 등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 시장 선점형 혁신 첨단 제품 ▲ 범용 제품의 고부가 전환을 통한 시장 전환형 제품 ▲ 탄소중립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규제 대응형 제품 ▲ 핵심 광물 대체·저감하는 공급망 확보형 제품 등 4가지 '도전 기술'을 지정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기반 구축 연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글로벌 1등 소부장 기업을 15곳까지 육성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대상 기업에는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7년 이상 장기 R&D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기간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2024년 83.3%에서 2030년 92%까지, 소·부·장 수출액도 2024년 3천637억달러에서 2030년 4천500억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함께 제시했다.
출처: 연합뉴스